미끄러지는 말들 백승주 지음 (서울: 타인의사유, 2022)
말을 배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언어에 대한 습득은 삶을 이루어나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평생의 학습이 아닐까. 그러면 어느덧 표준어를 구사하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한국어가 단일하고 균질한 것이며,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장면에서 동일한 말을 사용한다고(혹은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5~6쪽
이런 문장을 책의 도입부에서부터 만나게 된다면 앞서 가졌던 생각에 망치를 휘두르는 것 같으리라. 언어에 대한 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도록 만드는 문장을 만났다. 마치, ‘다문화의 이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진행되었을 것 같은 교양 과목처럼.
아무런 장벽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한국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하며 글을 쓸 때에는 문어체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언가 이렇게 해야만 ‘있어 보이는’삶이 되기 때문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언어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나는 국내산 인간이니까. 그나마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된 것이 사회복지를 조금이나마 공부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분야의 글들을 흥미롭게 읽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 책도 읽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저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특정한 주제의 글들을 읽게 된다. 또한 [책 속 칼럼]이 장의 말미마다 붙어 있다. 매우 흥미롭도록 전직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에 그랬다.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다.
책에 적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 문장들을 적어본다.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90쪽
내가 느끼는 것들을, 타인이 느끼길 바라며 글로 남기는 것일까. 아니면 일종의 강요를 위한 표현이 되는 것일까. 이미 말로 하려는 순간부터 그것은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닐까.
지도가 실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믿음이 길 찾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시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은 현실에서 우리의 방향감각을 마비시킨다. 150쪽
시험은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시험을 보면 다 아는 것이란 착각이 생각났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름인데 말이다.
이외에도 생각해볼 글들이 많이 담겨 있기에 직접 느껴보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 ‘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순간으로 나아가도록 달라질 수 있기를. 물론,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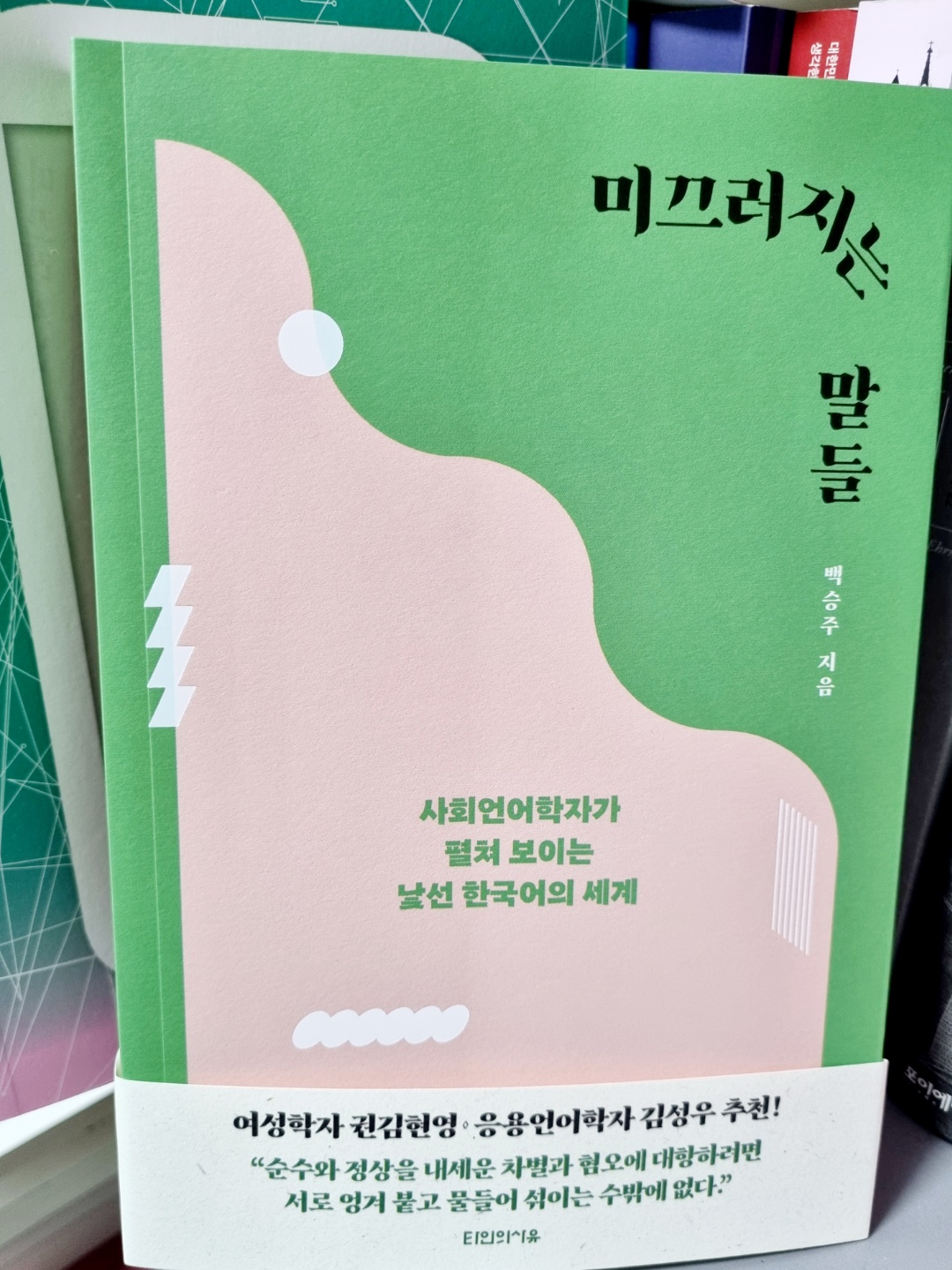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